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2021. 5. 9(일)
1-1코스 11.3km 천진항~우도 정상~하고수동 해수욕장~산호 해수욕장~천진항



제주 탄생 설화에 의하면, 설문대할망이 제주 본섬을 만들었는데, 한라산이 남쪽에 치우쳐 있어 오름들을 북쪽에 알맞게 배치해 섬의 균형을 잡았다. 오른발을 성산일출봉에 왼발을 오조리 식산봉에 딛고, 설문대할망의 오줌발에 생겨난 우도는 제주탄생의 마지막 마침표였다.
제주올레길은 본섬인 제주도 23코스, 섬 속의 섬인 우도와 가파도, 추자도를 일주하는 총 26개 코스 425km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은 가볍게 쉬어갈 겸, 짧은 11km인 우도섬 일주를 하기로 했다.



여전히 날씨는 황사 영향으로 시계는 좋지 못하다. 제주하면 늘 거센 바람이 먼지를 불어버려 코발트빛 하늘과 바다가 제주임을 알 수 있는데, 중국발 황사는 그 인해전술만큼 잘 사라지지 않는다.

인천 팔미도 등대(1903년)에 이어 두번째(1906년)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등대에는 슬픈 역사가 담겨있다. 1894년 청일전쟁 당시 서해 앞바다에서 청나라 함선과 교전을 벌일 때, 등대가 없어 고전했던 일본 제국주의는 등대를 설치하기 위해 한국의 해안을 측량했고, 인천을 기점으로 한국에게 등대를 세우게 했다. 지금은 바닷길에서 만나는 반가운 불빛 이지만, 그 출발점은 슬픈 제국 침탈의 역사가 출발점이었다. 한편 인천 팔미도 등대는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표식이었다고 하니 역사는 아이러니하다.



하수고동의 옥빛 해변과 산호 해수욕장의 코발트 블루 해변이 대조를 이룬다. 비교적 해수면이 낮은 하수고동 해변에선 수영을 즐기는 청춘들로, 산호 해변에는 사진을 남기려는 청춘들이 분주하다. 남태평양에서 볼 수 있는 산호해변을 보며,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되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제주도도 그렇지만 우도 역시 각종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어있다. 전국 어디에서도 이렇게 광활하게 펼쳐진 야생화는 단연 제주도일 것이다. 특히, 올레길에서만 볼 수 있는 야생화 천국은 꽃을 밟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길들이기에, 더욱 꽃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엉겅퀴에 내려 앉은 벌이 꿀을 채취중이다. 엉겅퀴는 곤충들에게 꿀을 제공하고, 곤충은 꽃들의 수정을 도와준다. 마크 트웨인의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자기만족'이란 용어를 빌리면, 꽃은 수정이란 자기만족을, 곤충은 꿀이란 자기만족을 성취한다. 다행이 이 둘은 공생관계지만 인간은 자기만족이 일방적일때 그 관계는 각종 범죄와 파국으로 귀결된다. 인간은 '자기만족'을 위해 사람과 관계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고생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식을 통한 자기만족의 대리 표현이지 않을까.

우도 코스를 가볍게 일주하곤, 숙소 인근의 오일장(4, 9일)에 들러 방울 토마토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한다. 내일은 숙소에 머물면서 도서관, 이발소에 들러 욱신 거리는 무릎을 보호해야 겠다. 해마다 올레길을 걷는 속도가 떨어지고, 체중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릎의 간절한 호소에, 내일은 무릎에게 휴식을 준다는 핑계로 '자기만족'해야 겠다.
사랑, 미움, 자선, 동정, 탐욕, 관대함 등은 자기만족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
마크 트웨인, <인간이란 무엇인가> 中
타인을 위한 사랑과 조직을 위한 헌신도 자기만족의 크기가 더욱 크기에 행동한다. '라면먹고 갈래'에서 시작해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란 대사로 유명한 영화 <봄날은 간다>도 자기만족이 충족되지 않은 결과다. 검은머리 파뿌리 되도록 살았던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헤어지는 두려움보다는 '자기만족'의 크기가 덜 두려웠기에 살지 않았을까. 결국 인간이란 '자기욕망'이란 노골적 단어보다는 '자기만족'이란 감추어진 형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닐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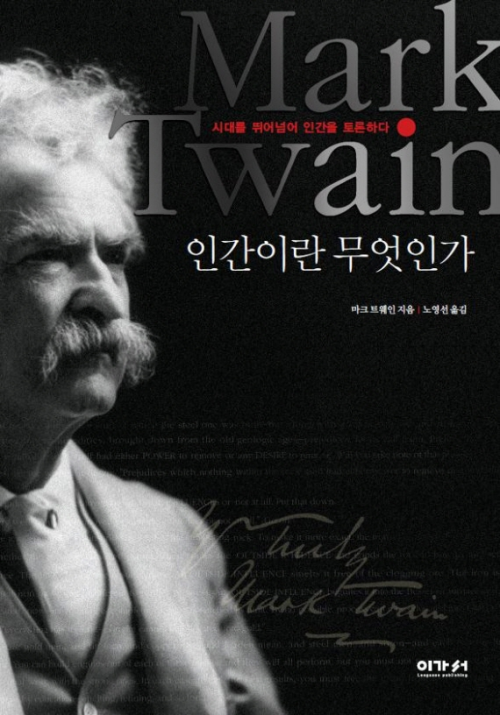
'올레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주올레 13일째 17코스, 길 위에서 만나는 예술이 생활 예술이다 (0) | 2021.05.12 |
|---|---|
| 제주올레 12일째 1코스, 밀밭에서 흔들리는 호기심을 보다 (0) | 2021.05.11 |
| 제주올레 10일째, 7코스는 올레길의 여왕? (1) | 2021.05.08 |
| 제주올레 9일째 10-1코스, 가파도 청보리밭에 일렁이는 바람 파도를 보고 (4) | 2021.05.07 |
| 제주올레 8일째 6코스, 창의력이 필요할 땐 6코스로~ (0) | 2021.05.06 |




